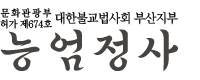의무제례와 선택재례 그리고 부정제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7. 의무(義務)제례와 선택(選擇)재례
그리고 부정(否定)제례
영가 제례에는 의무제례와 선택제례가 있다. 현재 우리들이 가정에서 모시는 제례는 모두가 의무 제례에 속한다. 의무제례는 유교식의 제례이다. 모시는 대상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주로 조상님들이다. 때로는 군(君)사(師)부(父)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을 향한 제례도 있다. 제례에는 일정한 규율이 있다. 관혼상제(冠婚喪祭)법인데 제례도 그에 속한다. 제례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제(喪祭)로 분류되는 1,2,3년상을 비롯해서 매년 모시는 기제사와 명절차례와 계절마다 모시는 춘(春)제 추(秋)제를 다양하고 복잡하다. 제례의 의식도 복잡하고 엄숙하다. 홍동백서(紅東白西)어동육서(魚東肉西)좌포우혜 등의 진설(眞設)의 규율이 있다. 제례를 올리는 순서도 복잡엄숙하다. 그래서 제례는 전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착민족에게만 가능한 조상숭배(祖上崇拜)제도이다. 선택제례는 말 그대로 선택해서 모시는 제례이다. 모시도 되고 안 모시도 된다. 조상의 은덕(恩德)을 기리고자 모시도 되고 마음이 안내기면 안모시도 된다. 마음이 불편한데 꼭 모실필요는 없다. 불교에서 봉행하는 제례방법이다. 불교에서 봉행하는 제례는 제례(祭禮)보다는 재례(齋禮)로 표기(表記)한다.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 한다는 개념이다. 49재(齋)가 그렇고 천도재가 그렇다. 요즘은 가정에서 모시든 기제사나 명절차례를 사찰에 의뢰하여 모시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도 제례가 아닌 재례가 되는 것이다. 재례에는 일정한 기준이나 순서나 규제가 없다. 물론 재례에도 의식의 기준이나 순서나 규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꼭 지키고 꼭 규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목욕재계하는 등의 정성은 꼭 필요하다. 꼭 육(肉)고기가 있어야 되고 어(魚)고기가 있어야 되고 꼭 밤 대추가 있어야 되고 꼭 전(煎)이 이어야 되고 꼭 나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가님이 생전에 좋아하든 한 가지 음식이라도 한 가지 과일이라도 정성을 다한 것이라면 만족(滿足)한 것이다. 또한 사찰에서 올리는 재례라고 해서 꼭 큰스님 꼭 비구스님 꼭 법사님이 아니라도 좋다. 보통스님 비구니스님 재가불자 누구라도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꼭 금강경을 독송할 필요도 없다. 천수경 지장본원경 아미타경이라도 된다. 불교는 브라만교의 병폐에 대항하여 발생한 종교이다. 브라만교는 고대 인도종교로서 브라만들의 착취와 패악이 심하게 자행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생한 종교가 불교이다. 당시의 인도에서는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족,귀족)· 바이샤(평민)·수드라(천민) 등의 4계급으로 나눈 사성계급이 존재했는데 브라만은 왕족보다도 더 높은 계급으로 인간이면서 신(神)가 상통(上通)하는 유일한 계급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占)치고 자유자재로 해결해주는 신으로 군림했다. 태양족의 후예로 알려진 사카족은 당시 인도 상류계급을 형성한 아리아족(族)은 아니다. 인도는 크게 두 인종으로 분류되는데 인도북부를 중심으로 아리아족이 70%를 차지하고 남부를 중심으로 드라비다인종이 25%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인도인의 70%를 차지하는 아리아족은 원래 이란의 북부지역에서 유목(遊牧)생활을 하다가 북부인도로 쳐들어와 갠지스 강과 인더스강 유역에 살고 있든 드라비다인들을 몰아내고 정착한 민족이다. 이들은 유목생활 후에 정착을 한 인종들이다. 이들은 영혼의 부활(upanayana)이라는 의식을 통해 정착 아리아인이 되었다는 핑계로 상위 계급을 구성하고 수드라(천민)들을 지배하고 기만하고 착치(捉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생겨난 이론이 업(業)사상이다. 이들은 영혼부활이라는 핑계로 업 이론을 왜곡하며 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리고 브라만교가 천민(賤民)가를 지배하면서 업장(業障)이론이 고착화 된 것이다. 정착화 된 업 이론이 오늘날 힌두교가 된 것이다.힌두교의 업장이론은 고착된 것으로서 고정불변(固定不變)이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 결정된 업장은 그 업장의 값을 다 치루기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힌두교인 들은 업장을 숙명으로 살아간다. 불교도 힌두교와 같이 업 이론을 수용(收用)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더 강하고 더 짙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고 더 옅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행(善行)하고 수행하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행하고 깨달아서 무상(無上)증득(證得)각(覺)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면 아예 없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신묘(神妙)한 우월성이 여기에 있다. 불교의 업 이론은 일체중생이 평등함에서 출발한다. 인간 뿐만아니라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이 평등한데 다만 업장에 따라 육도를 윤회하면서 업장에 상응(相應)과보(果報)를 받아 태어난다. 불교의 윤회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업장만 존재할 뿐이다. 가문(家門)과 선대(先代)의 조상들은 중시하는 것이 유교의 의무제례라면 불교의 선택재례는 가문보다는 인연을 중시한다. 그래서 우란분절 영가천도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7대(代)조(祖) 할아버지까지 모신다면 불교의 선택적 재례로 해석하면 7생(生)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7생(生)의 부모 속에는 꼭 인간만이 아닐 수도 있다. 꼭 지금의 성씨(姓氏)만이 아닐 수도 있다. 육도의 모든 중생이 포함될 수도 있고 사바세계의 모든 성씨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선택제례의 개념의 뿌리에는 불교의 대자대비 정신이 깃들어 있다.
유목민의 정서가 지배하는 종교에서는 제례도 간단명료하다. 물(水)과 초목을 찾아 떠나는 유목생활에서는 복잡하고 엄숙한 제례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부모님들의 기일(忌日)정도는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여앉아 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정착생활과 달리 정통보다는 실리(實利)에 매몰(埋沒)한다. 유목인들의 종교는 전통을 부정하기 싶다. 의무제례를 삶의 제일로 여겨온 유교문화권에서는 유목정서의 종교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6.25라는 민족상쟁의 전쟁을 통하여 원조물자를 가지고 가난에 빠져있든 민중 속을 쉽게도 파고들 수가 이었다. 그리고 의무제례에 지친 민중들속을 쉽게 파고들었다. 이들 유목종교는 전통제례를 미신(迷信)이라는 허울아래 아예 무시했다. 기일(忌日)도 무시했다. 추모제도 무시했다. 아예 모두를 미신으로 내몰았다. 부정(否定)제례가 된 것이다. 각종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의무제례의 폐단을 확대 과중 생산함으로서 가정주부들의 동요(動搖)를 불러오고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끝내는 이혼으로 몰고 가는 주범으로 등장하게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명절후의 달 2월과 10월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요즘은 아예 종교를 바꾸어 버린다. 의무제례의 유교에서 부정제례의 기독교로 개종(改宗)을 해버리는 것이다. 대개 개종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모시는 가정이 많다. 제례를 올릴 조상님들이 많은 전통의 종손(宗孫)집안의 가정이 대다수이다. ‘나 대(代)에서만 고생하면 됐지 자식 대에는 물러주기 싫다’하는 이유로 제례를 안 모셔도 되는 부정제례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헌데 우리나리는 원래 선택제례의 민족이다. 우리민족도 북방민족으로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와 정착한 이주민족이다. 원래 고정된 제례가 없었다. 돌 나무 물 등 자연에 제례를 올리는 토속신앙이 지배적이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서 불교가 국민들의 정서 깊숙이 파고들었다. 불교가 토속신앙을 수용함으로서 자연히 선택적 제례가 정착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팔관재(八關齋)나 천도재 우란분절재들이 정착되어 고려 후 조선 초기 까지 활발히 봉행된 것이다. 그러나 숭유배불정책의 조선건국이념에 의하여 점점 선택적 제례가 유교 이념의 의무적 제례로 바뀌어간 것이다. 충효(忠孝)를 근본 바탕으로 한 의무제례는 반상(反常)개념과 맞물려 급속도로 정착되어갔다. 제례를 잘 모시면 양반(兩班)이고 잘 모시면 상민(常民)이고 안모시거나 못 모시면 천민이라는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제다 동원하여 지극정성을 다한 것처럼 하여 모섰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제례에 대한 많은 폐단과 부작용들이 속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하여 유교를 숭상(崇尙)하고 의무제례를 모셨으나 서민들의 정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출세하기 위해서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서 양반대접받기 위해서 유교를 따르는 척하여서나 정서적으로는 불교정서를 따르고 있었다. 상유하불(上儒下佛)사대부 높은 벼슬아치들은 유교 상민 천민들은 불교를 신앙했다. 외유내불(外儒內佛)남자들은 유교를 여자들은 불교를 믿었다 소유노불(少儒老佛) 젊어서는 벼슬길에 나가기위해서 유교를 믿어서나 늙어서는 불교수행에 빠져들었다. 이런 힘으로 숭유(崇儒)척불(斥佛)의 조선의 국가이념 속에서도 불교는 명맥을 유지했고 불교의 선택적 제례도 계승될 수가 있었든 것이다. 헌데 유교의 의무제례를 불교의식으로 왜곡(歪曲)해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다. 불교에서는 의무적 제례는 없다. 선택적 제례뿐이다. 작금에 이르러서 의무제례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유교의 의무제례를 불교에서 수용하여 모셔주는 것이다. 옛날 토속신앙을 불교에서 수용한 것처럼 의무제례도 수용해주는 것이다. 이때는 제사(祭祀)가 아니고 재례(祭禮)가 되는 것이다. 재례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꼭 정성을 다 해야 한다. 제례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제례 때문에 종교를 바꿀 필요는 없다. 제례는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된다. 다만 정성을 다하면 된다. 이것이 선택적 제례의 장점이자 가르침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영가천도라고 한다. 불교의 선택적 재례에서는 일체 모든 영가님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원한다. 선택적 재례의 궁극적 목적은 역가(조상)님들을 업장의 굴레를 벗어나 극락의 세계로 보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영가)들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단 한 번의 제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세생생 쌓아온 업장소멸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천도재(遷度齋)를 올리거나 특정일(特定日)에 매년(每年)매회(每回)반복적으로 재례를 모셔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란분절(백중)영가천도로 연결된 것이다. 불교 알고 믿어야한다. 제례 정확히 알고 모셔야한다. 영가(조상)님들 제대로 알고 극락왕생 빌어드려야 한다. 제대로 알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