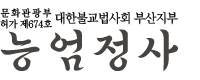참 깨달음과 깨달음의 허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참 깨달음과 깨달음의 허구
한 보살님이 웅봉법사에게 물어왔다.
“법사님 불법(佛法)이란 무엇입니까?
웅봉법사가 대답했다.
“불법이란 없다.”
또 다른 보살님이 웅봉법사에게 물어왔다.
“법사님 도(道) 도 하는데 도대체 도란 무엇입니까?”
또 웅봉법사가 대답했다.
“도란 것은 없다.”
또 다른 보살이 웅봉법사에게 물어왔다.
“도대체 깨달음(覺)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없다.” 웅봉법사가 실없이 대답했다. 웅봉법사가 제대로 알아서 대답하는 걸까? 아니면 개 코도 모르면서 조주선사를 흉내 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웅봉법사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 도 깨달음 등은 제대로 정의(正義)하기를 꺼린다. 식자(識者)들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표현으로 얼 무려 버린다.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청(自請)타청(他請) 대사(大師)들도 불자들의 물음에 제대로 설명 못하고 얼 무르고 깔아 뭉겨버린다. 오죽했으면 그들의 대화를 선(禪)문답(問答)이라고 했을까? 선문답은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을 말한다. 선문답은 엉뚱한 대답을 말한다. 선문답은 질문 근처(近處)에 가서도 안 된다. 질문과 아무런 관계없는 엉뚱한 답변을 말한다. 손톱 반만큼이라도 질문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알음알이에 걸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깨달은 척 하기가 매우 쉽다. 경전 한번 안 읽고 염불 한번 안 해보고 좌선(坐禪) 한번 안 해보고 큰스님 마하스님 대사님 행세를 하는 각자(覺者)들이 수두룩 빽빽한 오탁(五濁)악세(惡世)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일반 불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어서 불교가 어렵다 난해(難解)하면서 정법(正法)불교를 외면하고 방편불교 혹은 사이비(似而非)불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방편불교 유사(類似)불교 사이비불교를 신앙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유사불교나 사이비불교 인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알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깨달음의 한 소식을 한 큰스님 마하스님 대사(大師)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경전도 좀 읽어보고 주력(呪力)도 좀 염송해보고 참선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헌데 경전도 안보고 주력도 안하고 참선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하고 수행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세속(世俗)의 관심에 영합(迎合)하여 설쳐대는 꼴이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불교의 신앙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스님을 “스님이 젊다 스님이 잘생겼다 스님이 TV에 나오는 스님이다. 심지어는 옷 잘 입는 스님이다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스님이다” 등에 현혹되고 매료되어 몰려들고 빠져드는 재가불자들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다보니 스님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출연에 경쟁으로 몰려든다. 정상적으로는 신문이나 방송언론에 기고(寄稿)하고 출연하면 원고료(原稿料)나 출연료를 언론사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불교계의 언론 출연은 정반대현상이 적용된다. 원고료나 출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출연자들은 고액(高額)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대로 된 포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拘縮)하나 양화는 악화를 구축하지 못한다! 하는 소위 그레샴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나를 찾았는가?” 일붕 선사께서 하문(下問)하셨다.
“만법의 진리가 하나임은 알겠는데 하나의 진리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웅봉법사가 조바심속의 우답(愚答)을 올린다.
“그럼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일붕 선사께서 자비의 미소와 함께 애매한 가르침을 주신다.
“공(空)의 진리를 알겠는가?” 월산 대종사께서 하문(下問)하셨다.
“공(空)은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안 은 것도 아닌 자성(自性)이 없는 것입니다.” 나 웅봉법사가 확신에 찬 심정의 우답(愚答)을 올린다.
“자성이 없다? 더 열심히 일심으로 주력(呪力)해라!”
월산 대종사께서 준엄하고 무서운 경책(警策)하신다.
사실 나 웅봉법사는 고등학교시절에 일붕선사와 인연이 되어 출가를 권유받아가며 일붕선사의 지도아래 10년 세월을 선사의 문하(門下)에서 참선수행을 했다. 1960년대의 한국불교는 일붕 서경보스님의 불교라고 해도 과언(誇言)이 아닐 정도로 선사는 활동하셨고 인정받고 계셨다. 선사님의 권유와 압력(壓力)으로 불교에 첫입문한 나 웅봉법사는 선사님으로부터 ‘만법귀일(萬法歸一)일귀하처(一歸何處)만의 진리는 하나로 귀결되는 그 하나는 어디로 돌라가는가?’ 하는 화두를 받고 10년 세월을 참선(參禪)에 매달렸다. 선사님께서는 학교를 결석해서라도 참선에 매달리라고 초발심의 나 웅봉법사를 배려하시고 독려(督勵)하시며 수시로 챙겨주시고 점검해주셨다. 그러나 근기(根器)가 약한 나는 10년 세월의 넘는 참선수행에서도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방황의 계기는 화려한 승가의 외모만 보아온 나 웅봉법사를 선사께서 출가권유를 포기하고 신도회 활동을 권유하여 신도회의 요직을 맡게 되면서 발생했다. 초발심해서 부터 선사님의 청정한 계행만을 보아오다가 다른 승가의 막행막식(莫行莫食)을 비롯한 파계(破戒)범행(犯行)을 보고 불교와의 등을 지고 외도(外道)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나 웅봉법사의 제2의 삶이된 새마을운동참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송충이는 솔잎을 떠나 살수 없다.’는 속담처럼 인연이란 무서운가 보다. 30여년의 외도 속에서도 불교와의 인연은 계속된 삶이였다. 초창기 4~5년의 방황을 제외하고는 계속되었다. 관음정권도 10년 넘게 매달렸고 천지팔양경도 3만(萬)독(讀)을 독송했다. 그러다가 불국사의 월산대종사님을 친견하고 반야심경주력을 화두(話頭)로 받았다. 불국선원 조실 실(室)에서 친견하고 화두를 받았는데 불국사대웅전에 들려 100만(萬)회 독송(讀誦)을 부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불국선원과 정혜원(定慧院)을 찾아가서 월산큰스님과 스님의 애법(愛法)상좌(上佐)서인스님을 친견하고 일주일간의 주력수행의 결과를 점검받았다. 2년 세월동안 부산과 경주를 수백 번을 오르내리며 점검지도 받았다.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월산큰스님의 열반과 함께 대종사님의 점검지도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나 웅봉법사는 재가불자님들을 수행공간을 발원하고 재가불자로서 간(肝) 크게도 능엄정사를 창건하게 되었고 재가불자님들과 어울려가며 강의도하고 토론도하며 지도(指導)하며 함께 수행하기 시작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얼렁뚱땅 수행하며 가르쳤다. 불교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이라 얼버무려 가면서 온갖 어려운 용어(用語)들을 제 다 동원해가며 두루 뭉실 수행하며 지도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나 웅봉법사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했다. 반야심경 100만(萬)독(讀)을 화향하고 나서 수행에 자신감을 증득하고 새로운 화두(話頭)에 매달렸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나 웅봉법사가 화두를 내리고 나 웅봉법사가 화두를 받아 100만 독(讀) 주력에 8년 세월을 매진하여 성취하고 회향하였다. 병행하여 사시(巳時)기도로 16년 세월을 동안거 하안거 춘계기도 추계기도로 법화경(동안거, 춘계)과 지장보살본원경(하안거, 추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독경(讀經)해 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涅槃)의 깨달음을 알아 차렸다. 나무묘법연화경 제4품 비유품(比喩品)에는 ‘.......배우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사람도 또한 각각 스스로 이에 오온화합의 내가 참(眞) 나(我)라고 잘못 아는 그릇된 견해와 그리고 또 죽은 뒤에도 항상 내가 그대로 있다는 그릇된 견해와 죽으면 몸과 마음이 없어진다는 그릇된 견해들을 떠나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하오나 지금 세존 앞에서 듣지 못한 것을 듣자옵고 모두 의심하여 미혹함에 떨어졌나이다. 좋으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중을 위하시여 그 인연을 말씀하시어 의심하여 뉘우침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리불(舍利佛)존자가 석아모니부처님께 참 나 즉 진아(眞我)의 깨달음을 법문(法問)하시길 간청(懇請)하시는 구절(句節)이 나온다. 참 나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말하는 공(空)일까? 말과 글(文)로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일까? 불립문자(不立文字)일까? 아니면 형이상학적일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공(空)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대의라고 말한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삼법인(三法印)을 내세워 공(空) 불교를 최상승의 불교로 알고 있는데 깨달음의 경지는 공(空)이 아니고 무(無)이다. 공(空)의 논리를 비교적 소상(昭詳)이 설하고 있는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에는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이란 게송이 나온다. 불가득이란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깨달음에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있다 없다는 개념을 떠난 무심(無心)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무심은 무사(無思) 무상(無想) 무념(無念)으로 연결되는데 무념에 가깝다. 무념의 념(念)자는 지금 금(今)자 밑에 마음 심(心)자인데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무념이고 무심의 상태이고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 제4품 신해품에는 ‘우리들이 오래 동안(我等長夜) 공의 법을 닦아 익혀(修習空法) 색계 욕계 무색계의(得脫三界) 괴로움에 해탈하고(苦惱之患), 최후신의 유여열반(往最後身) 얻었노라 생각하며(有餘涅槃) 부처님의 교화 받아(佛所敎化) 참된 도를 얻었으니(得道不許)’.........로 이어지는 게송이 있는데 공(空)의 도리를 깨우쳐도 부처님국토(佛國土)를 장엄하지 못하고 보살도(菩薩道)를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인 대승의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하고 하루 가치의 깨달음인 소승의 깨달음 밖에 얻지 못한다고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럼 공(空)이란 무엇인가? 공(空)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공(空)이다. 그러나 인연을 만나면 다시 생겨나는 것이 공(空)이다. 비유하면 비워있는 병(甁)을 우리는 공병(空甁)이라고 한다. 이 공병이 물(水)라는 인연을 만나면 물병이 된다. 참기름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참기름 병이 된다. 깨소금을 만나면 깨소금 병이되고 심지어 오줌을 만나면 오줌 병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空)불교는 윤회(輪回)고(苦)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옥에 태어날 업보(業報)이면 지옥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날 업보이면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다. 참고로 극락(천상)에 태어나도 업력이 다하면 다시 육도(六度)윤회를 하는 것이다. 지장본원경 ‘12품 견문(見聞)이익(利益)품(品)에서 미래현재제세계(未來現在諸世界)중 유천인(有天人)이 수천복진(受天福盡)하여 유(有) 오쇠상(五衰相)이 현(現)하여 혹(或) 유타어악도지자(有墮於惡道之者)라도 여시천인(如是天人)의 약남약여(若男若女) 당현상시(當現相時)하여 혹(或) 견지장보살형상(見地藏菩薩形像)하고.........(해석)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어떤 천상인간이 천상(극락)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의 쇠퇴한 모양이 나타나거나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천상의 남녀들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이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뵈옵거나’.........로 설하고 있다. 선업(善業)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천상 복이 다하면 타락(墮落)하여 윤회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여(有餘)열반(涅槃)이라고 한다. 마하가섭존자가 말하는 하루가치의 공(空)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박사님 어떤 경지(境地)가 깨달음의 경지입니까?”
미천 목정배 박사님께 나 웅봉법사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없다 없어!”
미천 목정배 박사님께서 목청 높여 말씀하신다.
“모두들 성불(成佛)성불하는데 성불은 무엇입니까?”
나 웅봉법사가 다시 성불의 대의(大義)에 대하여 여쭈었다.
“없다 없어 없는 것이여!”
미천 목정배 박사께서 한껏 소리 높여 말씀하신다.
“다들 깨쳤다고 야단들인데 깨침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나 웅봉법사가 다시 여쭈었다.
“대의고 지랄이고 없어 괜히 폼만 잡고 있는 것이지 없다.”
그랬다 깨침의 경지는 없었다. 깨침의 경지는 원래부터 없었다. 석아모니부처님이 없다하셨고 법화경에서 마하가섭존자가 없다하셨고 반야심경에서 현장(玄裝)삼장법사(三藏法師)께서 없다고 하셨다. 나 웅봉법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일붕선사께서 없다하셨고 월산대종사께서 없다하셨고 미천 목정배박사께서 없다고 증명해주셨다. 나 웅봉법사가 모셨든 세분의 스승님들께서 모두들 없다(無)고 하셨는데 미련하게도 나 웅봉법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든 것이다. 나 웅봉법사가 깨달은 불교의 진리는 없는(無)것이다. 흔히들 불교는 공(空)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공(空)의 불교는 완전한 깨달음의 불교가 아니다. 공(空)에 매달리는 불교는 죽으면 영혼이 남는 유여(有餘)열반의 불교이다. 하루가치의 깨달음이다. 영원한 깨달음의 불교는 없다. 이때의 없다는 것은 있다(有) 없다(無)의 개념을 떠난 없음(無)을 말한다. 남음이 없는 무여(無餘)열반을 말한다. 즉 생사여부(生死與否)에 관계없이 영혼이 우주법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생사 유무를 초탈(超脫)하는 것이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분별심이 없는 우주법계가 하나가 되는 동체대지(同體大智)를 말하는 것이다. 동체대지의 깨달음은 보살 성문 연각 삼승(三乘)의 경지가 아니다. 수다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四果)의 경지도 아니다. 동체대비의 경지는 이들 삼승사과 경지를 초탈한 경지를 말한다. 불국토(佛國土)를 장엄하고 중생을 위한 무한회향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의 경지는 없다. 없음을 조주선사는 무(無)라고 말했고 없으니까 “백척간두(百尺竿頭)진일보(進一步)백척길이의 장대 끝에 올라가 한걸음 나아가라”가 가능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일귀하처(一歸何處)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모든 화두를 탐구해보면 결론은 없음 무(無)성립되는 것이다. 헌데 수행하지 않고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가는 어려울 것이다. 공부하지 않고는 딱 떨어지게 없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폼만 잡고 횡설수설하는 자칭 도사들도 많다. 이들을 법화경에서는 증상만(增上慢)이라 부른다.. 이들은 중생을 속인 죄를 범하여 업장(죄)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죄(重罪)의 업보를 받는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어도 수행을 계속해야한다. 이를 보림(保任)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空)의 불교가 얻을 수 있는 유여불교가 아닌 무(無)의 불교 즉 무여불교 지향(志向)하여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깨달음을 완성이란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 길이다. 바로 보살의 길이다. 깨달은 보살의 길이다.
나무석아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아모니불! 나무석아모니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