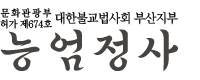한국불교의 발달과 민중(재가)불교의 역활. 제3 고구려불교(372~66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능엄정사관련링크
본문
3. 고구려 불교(372~668)
고구려의 불교유입은 종교적인 영향과 동시에 국가 정신 확립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왕권 강화라는 사상적 뒷받침과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내게 된다.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서기 372년(소수림왕 2년)에 중국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의 명에 따라 순도(順道. 인도 승려)가 불상(弗像)과 불경(佛經)을 가지고 오면서 불교가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고구려로 온 순도는 고구려의 왕과 신하들의 융숭한 대접과 함께 그를 귀인으로 맞이하였다고 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비공식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불교는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교가 공식적인 기록보다 먼저 전해졌으리라는 것을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梁: 502~557) 때 승려 혜교(慧皎: 497~554)가 저술한 양고승전(梁高僧傳)(519) 등의 문헌에 나타난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아무튼 2년 후인 374년에는 아도(阿道)가 들어와 성문사(省門寺) 혹은 초문사 (肖門寺) 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운 것이 한국 사찰의 기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교를 통한 공식적 도입이고 사실상 민간에 먼저 불교가 들어왔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수림왕은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에는 아도를 머물게 했다. 소수림왕에 이어 집권한 광개토왕은 불교를 본격적으로 정치적 활용을 전개했다. 서기 391년(광개토왕 1년)에 왕이 ‘불법(佛法)을 믿어 복을 구하라’고 공표하고 불교를 민중교화(民衆敎化)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광개토왕은 즉위 2년 만에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을 건립할 정도로 불교를 활용하여 민중을 규합하고 국력을 배양하고 국가 기반을 공고히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구려 불교는 호국불교로 출발했다. 고구려는 불교를 통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문화학습 방편으로 활용했다. 또한 이웃 국가와 외교를 강화하는 외교 방편으로도 활용했다. 초창기에는 불교문화 선진국인 중국 쪽에 의존하다가 중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구려의 고승들이 나라 밖으로 건너가서 구법(求法)과 전교활동(傳敎活動)을 전개할 정도로 불교가 정착화되었다. 396년경에는 동진(東晋)에서 담시(曇始)가 수십 종의 불경을 가지고 와서 불교를 전파하다가 10년 만에 돌아갔을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였으나 고구려 왕실의 지원으로 열심히 구법학습을 수행한 고구려 승려들이 중국의 승려를 지도할 수 있는 고승들도 있었다. 장수왕(413~491) 때 고승(高僧)인 상량(僧朗)은 중국에 들어가 삼론학(三論學)을 깊이 연구하여 학문적 체계를 개척하여 새로운 학설 신삼론(新三論)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승랑의 사상은 승전(勝詮), 법랑(法朗:507~581), 길장(吉藏:549~623)으로 이어졌으며 길장에 의해 새 종파인 삼론종이 성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승랑은 중국 사상계를 지도한 최초의 인물로서 중국에서 일생을 마쳤다. 고구려 학승들은 왕성한 전법(傳法) 활동은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일본 불교의 기반이 되어 일본 불교 학술과 예술 면에 큰 공헌을 남기고 있다. 일본 불교 최초의 전교자(傳敎者)인 혜편(惠便)을 비롯한 혜관(惠灌) 등 수많은 고승이 전법과 전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중에서 특히 혜관은 수(隋)의 길장(吉藏)에 삼론의 깊은 뜻을 배우고 통달(通達)하여 귀국 후 일본 불교의 승정(僧正)이 되어 삼론종의 종지(宗旨) 널리 전개하여 일본 삼론종의 종조(宗祖) 되었다. 고구려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 법륭사의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진 일이다. 또한 혜량(惠亮)은 551년(진흥왕 12) 신라로 가 신라불교 최초의 승통(僧統)이 되어 신라불교를 일으키는 데 커다란 계기를 제공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