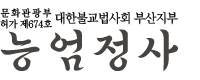기신이란? 불교의 사후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기(氣)신(神)이란? 불교의 사후(死後)관(觀)
지금처럼 최첨단(尖端)의 과학(科學)문명(文明)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鬼神)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
귀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는 나중의 이야기이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전제아래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우선 불교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알아보자!
부처님 재(在)세시(歲時)에 영취산 산 아래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며 부인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부인이 임신(姙娠)을 하여 출산(出産)일(日)이 다가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이 사셨던 삼천(三千)여년 전(前)
인도(印度)의 출산(出産)환경은 형편없이 열악(劣惡)했다.
출산 중에 산모(産母)와 태아(胎兒)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다.
이들 부부(夫婦)도 출산하다가 부인과 태아가 안타깝게 죽고 말았다.
제대로 출산준비도 못 갖춘 상태에서 볏짚을 깔고 출산(出産)하다가 많은 출혈(出血)로 죽은 것이다.
볏짚을 흠뻑 핏물로 적시고 온통 바닥을 피범벅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새로 태어난 아이를 찾아 힘 빠진 양팔로 허공을 헤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피투성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겨주니
아내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한 맺힌 주검을 한 것이다.
농부의 애통함은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했다.
눈앞의 참상(慘狀)은 평생을 잊지 못할 한(恨)이 될 것만 같았다.
아내와 아이의 장례를 치룬 농부는 슬프고 원통(冤痛)하여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잠만 청(請)하면 출산(出産)의 아픈 장면(場面)들이
눈앞을 가리고, 또 가리는 것이다.
농부는 몸은 점점 쇄약해지고 마음은 실성(失性)해 갔다.
그러든 어느 날 자정이 지날 무렵 잠을 못 이루고 한(恨) 맺힌
참상(慘狀)에 헤매고 있을 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죽은 아내가 불쑥 나타났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피범벅이 된 출산 시(時)
그때 그 모습으로 방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농부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당신혼자 이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는 당신을 두고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가겠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고
생시(生時)처럼 옆에 붙어 보채고 애원했다.
밤새도록 반가움은 멀리가고 무서움에 시달리다가
새벽녘 첫닭울음소리에 죽은 아내는 돌아가고 해방될 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 죽은 아내는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 같이 가자고 보채며
농부를 괴롭히고 농부는 지쳐가고 있었다.
참다못한 농부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라문을 찾아가 죽은 아내가
찾아온 사실을 자초지종(自初至終)설명하고 해결방법을 의논했다.
바라문은 출산하다 아이와 함께 죽은 아내가 원귀(寃鬼)가 되어
구천(九天)을 헤매고 있다고 했다.
아내의 영혼(靈魂)을 달래줄 천도(遷度)제(祭)를 권유하고,
양(羊) 일곱 마리와 벼 일곱 섬, 과일 일곱 수레를 비롯한 농부가
부담할 수 없는 제물(祭物)을 요구하였다.
죽은 아내와 태어나 햇빛도 한번 못 본 자식을 생각하면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천도(遷度)제를 올려주고 싶었다.
문제는 제비(祭費)였다.
제비(祭費)를 부담할 수 없는 농부는 천도 제를 올려 죽은 아내와
자식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빌어주기는 고사하고, 밤마다 죽은
아내의 보챔에 괴로워 자신의 생명(生命)마저 마감하고 싶었다.
자살(自殺)을 결심한 농부는 목을 맬 노끈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마을 뒤 산(山)을 오르고 있었다.
마침 농부가 자살을 결심한 산이 부처님이 계시는 영취산 이였다.
산(山)을 오르는 농부를 보고 부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결심을
한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부처님을 농부를 보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오.
나에게 그 사연(事緣)을 알려 줄 수 없겠소.
내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어 들이고 싶소.
수도자 모습의 부처님을 보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농부는 그동안 죽은 아내와 아이와의 사연을 자초지종(自初至終)또 설명했다. 농부의 사연을 다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그럼 날 따라오세요. 내가 도와 주리이다. 하고
농부를 부처님의 처소(處所)로 안내했다.
“농부님! 내가 한 가지 방편(方便)을 알려드리리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하시고는
팥 그릇에서 팥을 세알을 세어서 농부에게 건네주었다.
“농부님 이것은 팥 세알이외다.
오늘 저녁에도 아내가 찾아와 같이 가자 또 보채면 이 팥을 쥔 주먹을 내 보이고 주먹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하면 이 팥을 아내를 향하여 던져 보세요,
그럼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요.
만일 팥이라는 것을 알면 몇 개인지 물어보세요,
몇 개인지를 모르면 아내를 향해 던지세요.
그럼 해결이 잘될 것이 외다.
부처님으로부터 팥과 방편(方便)을 전해들은 농부는
손에 팥을 꼭 쥔 채 집에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지날 무렵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피투성이의 아이를 안고
핏물을 뚝뚝 흘리며 또 찾아왔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가서 우리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농부의 옆자리에 누워 농부를 보채고 또 괴롭히기 시작했다.
농부는 무서움에 떨면서 주먹을 불쑥 내밀어 보이며
죽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이게 무엇이요?
죽은 아내는 의아해 하면서 “무슨 물건은? 팥이네요.
하고 단번에 알아 맞혔다.
“그럼 몇 개인데? 계속되는 물음에 아내는 ”
세 개요. 하고 짧게 대답했다.
농부는 그날 저녁 팥 한번 못 던져 보고 밤새도록
죽은 아내의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그럼 그렇지 별수가 있으려고? 천도제도 안올렸는데?
농부는 다시 노끈을 찾아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보고 계시든 부처님이 농부를 찾아와 위로했다.
“농부여! 안 됩디까? 팥의 개수가 적었는가? 봅니다.
오늘은 내가 다섯 알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 보세요.
아무리 귀신이라도 이것을 모를 것이요.
부처님이 세어준 팥을 손에 쥐고 농부는 또다시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죽은 아내는 어김없이 피투성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핏물 범벅이 되어 핏자국을 만들면서 다가와 옆자리에
누우면서 보채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서 우리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자.
보채는 아내를 향해 주먹을 살짝 내밀고 농부는 물었다.
“여보 내 주먹 안에 무슨 물건이 들었소?
“물건은 무슨 물건? 팥 다섯 알이 들었건만?
다소 퉁명스럽게 아내가 대꾸했다.
농부는 그 밤도 또 다시 팥 한번 못 던져보고
밤새도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빌어먹을 돌팔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차라리 죽게 나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농부는 노끈을 손에 칭칭 감고 잔뜩 화를 내며 산을 올랐다.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와도 외면하고 산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농부여! 미안 하외다. 부처님은 우선 사과부터 했다.
“농부여! 죽음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오.
스스로 주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 죽고 싶으면 오늘밤에
그대의 죽은 아내를 따라나서면 될 것 아니오.
딱 한번만 더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농부를 달래서 부처님 처소(處所)로 이끌었다.
“사문이시여!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팥 말고 다른 방편을 알려주십시오.
팥 그릇을 챙기는 부처님을 향하여 농부가 말을 했다.
“그래요? 오늘 한번만 더 이방편을 써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부처님은 팥 그릇 속으로 손을 넣어 헤아리지도 안은 몇 알의 팥을
농부주먹에 쥐어주었다.
농부는 부처님이 주는 몇 알의 팥을 주먹에 곽쥐고
밤이 오길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아내는 밤이 깊어 자정이 조금 넘자
피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방문을 들어서는 아내를 향하여 또 다시 실패 할까?
두려워 힘없이 주먹을 내 보이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이게 무슨 물건이오?
농부의 목소리와는 달리 아내는 앙칼진 목소리로 무섭게 답했다.
“물건은 무슨 물건? 팥이네.
왜? 요즘 팥을 가지고 그렸는데? 짜증나게.
아내는 또다시 귀신처럼 알아맞혔다.
“그럼 몇 알인데?
농부는 아내의 무섭고 당당한 목소리에 풀이 죽어
기어드는 모기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당당하던 죽은 아내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아내는 당황하고 있었다. 아내의 당황함을 본 농부는 자신을 얻어
죽은 아내를 향하여 팥을 던졌다.
팥 세례를 받은 죽은 아내와 아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농부가 죽은 아내귀신의 장애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죽은 아내 귀신은 팥의 개수를 몰랐다.
왜? 아내 귀신이 이번에는 팥의 개수를 알지 못했을까?
인지(人知)면, 귀지(鬼知)요.
인불지(人不知)면, 귀불지(鬼不知)이다.
사람이 알면 귀신도 알고, 사람이 모르면 귀신도 모르는 것이다.
부처님이 농부에게 팥의 개수를 알려줌으로서,
농부에게 붙은 아내귀신도 팥의 개수를 알았다.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농부에게 팥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음으로
농부는 몰랐다.
농부가 몰랐음으로 아내귀신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귀신(鬼神)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에 귀신(鬼神)이 존재(存在)하면 실제로 귀신은 존재한다.
마음에 귀신(鬼神)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存在)하는
귀신(鬼神)도 벗어날 수가 있다.
불교에서 본 귀신(鬼神)은 존재(存在)하면서도 존재(存在)하지 않고,
존재(存在)하지 않으면서도 존재(存在)한다.
인정(認定)하면서도 부정(否定)하고 부정하면서도 인정한다.
한마디로 깨달음을 증득한 불, 보살님들의 세계에는 귀신이 없다.
그러나 미혹(迷惑)한 중생에게는 귀신은 존재한다.
범부중생의 마음에 따라 귀신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생(衆生)의 마음 따라 귀신(鬼神)의 마음도 달라진다.
귀신의 위해(危害)유무(有無)도 달라지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마음공부이다.
마음을 닦는 수행(修行)의 결과에 따라 귀신의 존재(存在)가 달라지고
수행의 방법에 따라 귀신(鬼神)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 천도(遷度)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불교에서는 귀신(鬼神)을 숭배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사(四)천왕(天王)을 비롯한 신중(神衆)단의 신장(神將)님들과 용신(龍神), 산신(山神)등 모든 신(神)들을 수용(收用)할뿐이지
우상화(偶像化)하거나 숭배(崇拜)의 대상으로는 모시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불(成佛)에 있고 수행의 최종목표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의 불성(佛性)을 되찾는데 있는 것이다.
내가 부처(佛)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과정에서 이들 신(神)들이
나를 보호(保護)해주고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이들을 숭배(崇拜)하고 이들의 지배(支配)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다.
사찰에 모셔진 사천왕(四天王)이나 신중(神衆)님이나 용왕(龍王),
산신(山神)님 등은 그 신(神)들 자신이 부처님을 모시고 지키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