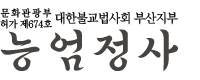귀의법 이욕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귀의법 이욕존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다라서 업(業)이 형성된다.
착한 일을 하면 선업(善業)이 악한 일을 하면 악업(惡業)이 생겨나는 것이다.
법률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 판사가 되고 의과대학(醫科大學)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의학박사 가된다.
꼭 공부가 아니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되고 힘 있는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한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남들보다도 더 노력해도 안 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길이 있다.
부모 조상 자신의 원(願)에 의하여 태어나는 길 원력중생(願力衆生)과,
자신이 전생(前生)에서 행한 업(業)에 따라 업(業)을 안고 떠밀려서 태어나는 업보중생(業報衆生)의 길이다.
전생에서 황제라도, 전생에서 세계최고 부자이라도, 금생에 태어나면서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어느 것 하나 못가지고 빈손으로 태어난다.
다만 전생에서 황제로서의 지은 업(業)과 부자로서의 지은 업(業)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저질은 업(業)만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생은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가 아닌
업수래(業手來), 업수거(業手去)것이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을 안고 왔다가 업(業)에 따라 살다가 업(業)을 안고 가는 것이다.
업을 우리는 한때 유전자(遺傳子)라 부르다가 요즘은 D, N, A,라고 부른다.
유식(唯識)불교(佛敎)에서는 아뢰아식, 제8식, 함장식 이라고 부른다.
약간의 개념차이는 있지만 혼(魂)이 인간의 순수한 진아(眞我), 불성(佛性)
이라면 영(靈, 껍, 껍데기)이 업(業) 인 것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혼과 영이 결합된 영혼(靈魂)의 세계다.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오온(五蘊)에서 색(色)은 육체이고
수, 상, 행, 식은 영혼인 것이다.
순수한 불성 진아(眞我) 혼(魂)이 어떠한 영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의 정신세계 달라지는 것이다.
혼(불성, 진아)이 영(업,業)에 물드는 것이다.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육체도 영(업,業)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혼의 순수한 우리말은 “얼”이다. 민족혼이나 민족 얼이나 같은 말이다.
순수 혼이 업(業) 즉 영(靈,껍, 껍데기)을 만나 업에 물든 얼의 모습으로
육체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얼의 모양? 모양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꼴이라 고한다.
얼의 꼴 얼 +꼴 =얼 꼴 얼굴을 말하는 것이다.
얼굴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얼 꼴로 나타난 그 사람의 업(業)의 모습을 보고 점치는 것이다.
눈이 작으면 간이 크고, 눈이 크면 간이 작아 겁아 많고,
귀가 잘생기면 덕이 많고, 코가 잘생기면 복이 많고, 입이 잘생기면 식복이 많다, 는 등 얼굴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관상(觀相)이라고 한다.
업의 모습은 꼭 얼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도 나타난다.
얼굴이 크냐? 작으냐? 키가 크느냐? 적느냐? 목이 기느냐? 짤 으냐?
목이 굵느냐? 가느냐? 여러 가지 신체모습을 보고 구분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관상법이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정립한
동의 이제마 선생도 얼굴과 신체적 구조를 관상(觀相)으로 관찰하여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으로 분류하여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 한 것이다.
조선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을 치룬 대신들 중에 오리 이원익 대감에 관한 이야기다.
왜군에 쫓겨 서울을 내어주고 평안도 의주로 몽진한 선조임금은 망국(亡國)의 절대적 위기에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때 명나라 대군을 이끌고 오는 이여송 장군을 영접하는 영접사로 오리
이원익 대감이 선발되어 압록강 삼각주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복걸 영접을 하게 된 것이다.
역사에 전해오는 것처럼 명나라 이여송 장군은 키가 8척 장신이다.
8척 장신 앞에선 영접사 이원익 대감은 5척 단신(短身)인데 하물며 머리마저 조아리며 애걸복절 하였었니. 볼만한 행사였을 것이다.
8척 장신에 거들먹거리며 행사장에 들러서든 이여송은 이원익을 보는 순간 자세를 가다듬고 겸손해 지면서 혼자말로 중얼 거렸다.
“참말로 아깝다, 키가 한 치만 작아도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 인 것인 것을” 오리 이원익의 키를 보고 한말 이였다.
이여송장군이 이원익대감의 관상을 본 것이다.
이여송은 문(文)무(武)를 겸비한 사람이라 관상에도 밝은 장수다.
이여송장군이 관상은 바로 본 것이다.
사실 오리 이원익 대감은 명나라 대장군 이여송의 키가 8척 장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5척 단신인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어 굽이 높은 나막신을 신었던 것으로, 이원익대감의 실제 키는 이여송이 본 키보다 한 치가 작았던 것이다.
오리 이원익 대감은 이여송의 말대로 그 후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영의정에 올라 광영(光榮)을 누렸던 것이다.
이여송이 본 오리 이원익 장군의 관상(觀相)은 신상(身相)을 본 것이다.
우리가 관상 하면 얼굴 모습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관상은 신체 전체모습을 보는 것이고 얼굴 모습만 보는 것은 면상(面相)이다.
면상을 본다,
그런 말은 들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관상 소리는 들어봐도 말이다.
두상(頭相)만 가지고, 면상(面相)만 가지고, 흉(胸相)만 가지고, 족상(足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런 학문들이 존재 하지도 안는다.
우리의 신체 한부분 만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체의 한부분 만으로도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손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는 것이다.
손의 모습을 보고 운명을 감정하는 학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전수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손금 이라고도 부르고 수상(手相)이라고도 한다.
이 수상(手相)을 이야기 하고자 장황한 설명들을 지금까지 널어놓았다.
왜 그럼 손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인수가 있는 것일까?
손은 업(業)을 직접 짓고 쌓아가는 신체 기관이다.
인간의 삶이란 일평생을 싫든 좋든 서로 주고받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가는 행위이다.
거래(去來)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이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거래를 경제라 부르다.
한문으로는 수수(收受)라고 표기한다.
수수(收受)행위가 업이 되어 업의 꼴로 손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手)자를 우리는 손 수(手)라고 부른다.
그냥 손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왜 굳이 수(手)라고 부를까?
수수(收受)의 행위가 그대로 그 꼴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옛날 대갓집 혼사에는 사성(四星)가고 택일(擇日)오고 혼사 마무리 과정에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신부 상옷을 해준다며 신부의 몸 품을 요구한다.
보내온 신부의 옷 품을 보고 신랑 집에서 파혼을 통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유인즉 신부의 팔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전생에서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지를 안했기 때문에 팔 길이가 짧다. 전생에서 베푼 것이 없다면 금생에서 남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파혼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팔 길이가 긴 것을 길상(吉相)으로 본다.
삼국지(三國志)에서 덕(德)이 많은 성군(聖君)의 대명사 유비현덕의 팔은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적고 있다.
부처님의 삼십이상(三十二相) 팔십종호(八十種好)에도 부처님의 팔 길이가 무릎을 덥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팔이 길다는 것은 남에게 팔을 벋쳐 밖으로 많이 주었다는 뜻이다.
팔이 짧다는 것은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받아먹기만 해서 팔이 안으로 오므라들었다는 뜻이다.
짧은 팔은 남의 것을 얻어 줄만 아는 인색한 삶의 얼 꼴이다.
우리는 인심 좋고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을 실제 손의 크기에 관계없이
손이 크다고 한다.
반대로 남에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 것에만 연연하는 사람을 실제 손의 크기에 관계없이 손이 작다고 한다.
이처럼 손은 우리의 경제, 거래(去來), 수수(收受)행위에 따라서 그 모습,
그 얼의 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경제, 거래, 수수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수수(收受)행위는 수(水)처럼 하라는 것이다.
물(水)처럼 부담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다.
물처럼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을 수상(手相)에서 알아보자.
수상(手相)은 손금을 보는 것인데 손금이 끊어짐 없이 얼마나 물처럼 잘 흐르고 있는가를 손바닥에서 찾는 것이다.
손바닥에는 세 개의 큰 선이 그어져 있다.
그 선들은 모두 엄지와 검지 사이 검지 가까운 지점 볼록 솟아 있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모든 강(江)들이 높은 산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 손바닥 제일 위를 지나가는 선인데 이선은 분별선이다.
I, Q, 지능지수를 보는 선이다.
이선이 세력 좋게 흘러가면 분별력이 빠르다.
지능지수는 보다 빠른 분별력을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수이다.
산에서 출발한 강물이 강(江)의 길이가 짧으면 속도가 빠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은 급(急)하고 여성들의 멘스 주기(週期)는 대체로 23일이며 한 달을 못 채우는 형이다.
두 번째 손바닥중간을 지나가는 선인데 이선은 감정 선이다.
E, Q,를 보는 선이다. 이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감정이 풍부하다.
산을 출발한 강(江)의 길이가 적당하여 즐길 것은 즐기며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은 다정다감(多情多感)하며 여성들의 멘스 주기(週期)는 대체로 28일이며 정상적인 한 달 형 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비교적 이선이 들 발달되어 있으며,
이웃 일본 여성들은 잘 발달되어있다.
감성과 28이라는 숫자 불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다.
부모를 떨어진 어린아이들이 낮에는 부모를 잊고 잘 놀다가도 해가 저물면 울기 시작한다.
떨어진 부모생각이 나는 것이다.
어린이이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도,
나르는 새들도 해가지면 자기 집을 찾아든다.
만(萬) 중생들의 본능인 것이다.
사찰에서 저녁 종은 28번을 친다.
생로병사(生老病死), 사고팔고(四苦八苦)를 해결하고 108 번뇌(煩惱)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고자 출가를 감행한 스님들이 만에 하나 감성에 끌려서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감성을 끊으라고 28회의 저녁 종을 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지 옆 솟은 곳에서 손목 중간지점을 행하여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금인데 지혜 선이라고 한다.
S, Q 사회성 지수선 혹은 영(靈)선이다.
이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지혜가 많아 원만한 사회생활은 영위할 수가 있다. 이선은 길다, 선이 길다는 것은 강(江)의 길이가 길다는 뜻이다.
산을 출발한 강물이 조급함 없이 서두름 없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뜻한다. 양보할 것 양보 다하고 아주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다.
있는 것은 여유뿐이다. 지족(知足)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손금을 소유한 여성들은 멘스도 서두를 것이 없다.
멘스 주기는 33일로 대체로 한 달을 넘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33이라는 숫자도 불교와 아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의 33응화신(應化身), 33비상천(非想天),등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33은 지혜의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다.
33은 지혜를 만드는 길수(吉數)다.
우리의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33인이다.
이는 독립 운동가들이 모자라거나 넘쳐서가 아니라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주도 했던 인물이 자랑스럽게도 우리불교계의 백용성 스님과 한해 한용운 스님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3시에 33회의 종을 친다.
이것은 오늘도 지혜롭고 여유롭고 지족의 하루가 되어 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매년 새해벽두 1월 1일 0시에 보신각종을 33회의 타종을 하는 뜻 깊은
사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손금을 보는 것은 손바닥에 그어져있는 금
선들을 물의 흘러가는 모습과 대비하여 점치는 것이다.
손바닥에 흘러가는 물의 모습을 점치는 것이라고 수상(手相)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손수(手)자도 가로로 된 세 개의 금이 얼마나 잘 흐르는가?
를 보는 세로로 금을 그어 표현했는지도 모른다.
물은 막히면 쉬었다가고, 걸리면 돌아가고, 갈라졌다 모여들고,
스며들었다간 솟아나고 물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물은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자신이 더러우면 스스로 침전(沈澱)하여 스스로 정화한다.
물은 불구부정(不垢不淨)이다.
물은 열기(熱氣)를 만나면 끓어 수증기가 되고,
냉기(冷氣)를 만나면 얼어 얼음이 되어 고체가 된다.
물은 외부의 변화에 정확하게 작용한다.
물은 거짓이 없다. 물은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순리(順利)대로 흘러간다.
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眞理)이자 법(法)인 것이다.
불교에서 진리를 뜻하는 법(法), 법(法)자는 수(水)변에 갈 거(去)자다.
물처럼 순리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법(法)이 아닌 것이다.
같은 법(法)을 가지고도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인들은 법리(法理)해석이
각양각색(各樣各色) 천차만별이다.
같은 법을 가지고도 문중에 따라 스님들의 법리(法理)적용이 다르다.
오죽했으면 법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했을까?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진정한 진리(眞理) 그것이 진정한 법(法)이다.
귀의법(歸依法) 이욕존(離慾尊), 사리사욕(私利私慾)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난 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
진정한 불제자의 당당한 삶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말없이 살라하네 푸르른 저 산들은, 티 없이 살라하네 드높은 저 하늘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