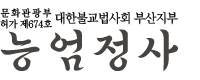마음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좌(左) 뇌(腦)나 우(右)뇌(腦)에 의하여
전달되는 사량(思量)분별(分別)을 말하는 것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사량 분별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 본성(本性)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량 분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량 분별하는 본성(本性) 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변한다고 한다.
왜? 열두 번도 더 변할까?
사람의 감각기관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 오감(五感)과 이를 받아들이는 의식(意識)으로 이루어진다.
불교의 유식(唯識)학에서는 육체의 오감(五感)기관이 식(識)을 만나
작용하는 단계를 전(前) 오식(五識)라고 부르고, 전오식(五識)을 떠나서 홀로 작용하는 의식(意識)을 육감(六感) 제육식(第六識)이라고 부른다. 오식(五識)과 육식(六識)은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냄새는 맞는다고 해서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7식 마라 식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작용한다.
즉 받아들어 기억하는 것만 식(識)되는 것이다.
받아들여 기억하고 집착하는 것은 업식(業識)이 된다.
이 식(識)을 제8식 아뢰아식, 또는 함장식이라고 한다.
다음 생(生)까지 가지고 가는 유전(遺傳) 종자(種子)식(識)이다.
인간의 본성(本性) 본(本) 마음은 무구(無垢)청정(淸靜)하여 무색(無色) 무취(無臭) 무념(無念)의 공심(空心)이다.
제8식 아뢰아식에서 연기(緣起)된 공심은 업(業) 종자(種子)의 염도(染度 색깔)에 따라 오식(五識)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식(識)의 내용과 작용 달라진다.
제6식 의식(意識)도 마찬가지이다.
취사선택(取捨選擇)이 달라지는 것이다.
선호(選好)도가 달라진다. 좋고 싫고 가 선택된다.
선호도에 의하여 취할 것은 취(取)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사실은 범부(凡夫)중생의 마음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나(我)라고도 한다.
육식(六識)에서 좋고 싫고의 양분된 두마음은 12마음이 된다.
쥐처럼 약삭빠르고 민첩한 마음이 있는가하면,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마음도 있다.
토끼처럼 날 세고 순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처럼 무섭고 천하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자(子)축(丑)인(寅)묘(卯)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한다.
들은 대로 따라한다. 맛보는 대로 따라한다.
그러고는 점점 그대로 습관화 되어간다.
그 집 가풍에 물들고, 그 사회 정서에 물들고,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길들어져 가고,
세파(世波)에 물들고 중생심에 물들어 가는 것이다.
범부중생의 마음은 하루에 12번 변화(變化)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변(變)한다고 한다.
이는 범부중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깨달은 성인의 마음은 부동(不動)심(心)이다.
이중(二重) 인격자(人格者)도 있다. 이중인격자(二重人格者)는 하루에 24번 마음이 변(變)하는 사람을 뜻한다. 믿을 사람이 못되는 사람이다.
삼중(三重)인격자(人格者)도 있다. 삼중(三重) 인격자(人格者)는 하루에 마음이 36번 변(變)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뺑 돈 사람으로
취급한다. 360도 뺑 돌아버린 사람으로 분류하며 정신병원자이다.
사중(四重) 인격자(人格者)도 있다. 사중(四重) 인격자(人格者)는 하루에 마음이 48번 변(變)하는 사람이다. 4, 8뜨기 이다.
이쯤 되면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객관과 보편성이 결여되고
완전한 자기중심의 정신박약아가 되어 주위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가 있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쯤 우리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변(變)할까?
말할 필요도 없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시골집 할머니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은 죽 끓듯이 시(時)도 때도 없이 변화(變化)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원숭이 농장에 흉년이 들었다.
원숭이들의 식량이 절대 부족하여 원숭이들이 굶어죽게 되었다.
농장 주인은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원숭이들아 너희들이 보는바와 같이 우리농장에 흉년이 들어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긴축 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일부터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를 지급하겠다. 서로가 궁핍하드라도 참고 견디며 올 겨울을 슬기롭게
보내자. 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인님!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도토리 3개는 너무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숏아 졌다.
"그래서는 배가 고파 못삽니다. 다른 방도를 연구하여 주십시오.
좀처럼 시끄러움은 정리되지 않았다.
그때 농장주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한 끗 양보하는 척 제의했다.
"좋다! 그럼 아침에 도토리 4개 저녁에 3알을 주겠다. 되겠느냐?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났다. 모두가 좋다고 박수를 보낸 것이다.
그 유명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이야기다.
똑 같이 하루에 7개인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들 원숭이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아마도 다이어트를 했는가 보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적게 먹기를 선택했었니. 말이다.
인간의 삶은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살이야 한다.
전생(前生)의 과보로 금생(今生)삶이 결정되었고.
금생(今生)의 과보로 내생(來生)의 삶이 결정되니 말이다.
멀리 볼 것 없다. 어제가 전생(前生)이고 내일이 내생(來生)이다.
바로 이 순간 1초전이 전생(前生)이고 1초 후가 내생(來生)인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 달다. 는 식의 삶이 마음이 아니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우선은 쓰고 부족하드라도 매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오감(五感)육감(六感)의
작용으로 탐, 진, 치 삼독 심으로 유발(誘發)된 욕망의 마음은
본마음 본성(本性)이 아니다.
번뇌(煩惱)이자 망상(妄想) 이다. 번뇌 망상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번뇌 망상이 마음으로 존재하는 한
중생은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사고(四苦)팔고(八苦) 108번뇌(煩惱)라고 한다.
어리석은 원숭이들처럼 우선당장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난금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미래의 이익에 눈을 돌려야한다.
중국 선종의 2대조사 혜가대사는 일찍이 학문에 관심을 두고 피나는
정진을 통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학문을 두루 통달하여
당대 중국제일의 대 학자가 되었다. 그의 학문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든가?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번뇌를 깊어만 갔다.
학문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의 고통은 쌓여만 갔다.
인간의 번뇌 망상은 사량 분별의 알음알이와는 무관함을 깨달고
새로운 방황을 시작할 무렵 숭산(崇山)) 소림사에 인도(印度)로부터
건너온 대덕(大德)화상(和尙)이 자리 잡고 앉아 면벽(面壁) 수행을
9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부동(不動)하기는 그지없고, 번뇌 망상을 완전 여왼 대(大)선지식(善知識)이라는 소문이 낭자했다.
불혹(不惑)의 나이 40세를 훨씬 넘긴 노장학(老壯學)의 대가(大家)
혜가는 이 소문을 듣고 보리달마를 만나기 위해 소림사로 찾아갔다.
“존자시여 감로의 법문을 활짝 열어 번뇌의 이 중생을 건져주소서!
때마침 내리는 눈밭에서서 고통과 번뇌를 여윌 한 소식 감로(甘露)의 법문을 청(請)했건만 방안에서는 한 점의 미동도 없이 눈앞의 벽만
뚫려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 눈은 쌓여 무릎을 덥고 허리를 거쳐 가슴까지 차오르건만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다.
번뇌 망상을 여윌 신통(神通)한 가르침을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애걸복걸(哀乞伏乞)의 하소연을 거쳐 분노(忿怒)를 거쳐 오기(傲氣)로 변하는가. 쉽더니 자포자기로 변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처음 출발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도 공부를 할 만큼은 했고,
수행할 만큼은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라고 별 수 있어?
어디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반신반의(半信半疑)의 비교심리와
분별심(分別心)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럼 그렇지, 알긴 뭘 알아? 헛소문이야!
노자(老子)장자(壯者)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에 통달한 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번뇌 망상을 네가 감히 해결할 수 있다고?
풍문으로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나 만나기가 두려워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이겠지.
배운 자의 오만한 증상심(心)으로 변하는가 하면,
“이 나라 최고의 학자인 나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오기심(傲氣心)으로 바꿔다가 마침내 평정심(平靜心)을 되찾았을 무렵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부드러우면서 알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의 지혜는 여러 겁을 수행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너의 작은 뜻으로는 큰 법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꼭 법을 구하려거든 정표를 보여라!
순간 혜가는 허리에 찬 삭도(削刀)로 팔을 잘라 달마대사께 받쳤다.
선종(禪宗)사찰 벽화에 가끔 등장하는 유명한 설중(雪中)단비(斷臂)이다. 그리고 방으로 안내되어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대가 나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고?
달마대사의 물음에 혜가는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 참 어려운 것이구나, 마음을 내 놓아보아라!
내가 마음을 고쳐주마. 달마가 마음을 내어 놓기를 요구하자
마음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혜가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답했다.
“마음을 내놓으려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마음을 내가 이미 다 치료하여 놓았다.
이 한마디에 혜가는 일성대각(一聲大覺)하고 중국 선종의 2대 조사(祖師)가 된 것이다.
과연 혜가는 이 한마디에 깨달은 것일까?
아니다 진짜는 눈밭에서 오랜 시간을 시간과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미 대각(大覺)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분별, 증상, 오기, 분심(忿心)을 모두 눈 속에서 이미 삭일대로 삭이고 인욕(忍辱)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달마대사를 만난 것이다.
곰 삭이는 마음, 인욕의 마음은 양(陽)심(心)이다.
밝고 따뜻한 마음은 양(陽)심(心)이다. 양(陽)은 버릴 줄 안다.
양(陽)은 떠날 줄 안다. 양은 비울 줄 안다.
애(愛)태우는 욕망(慾望)의 마음 음(陰)심(心)이다.
어둡고 차가운 마음 음(陰)심(心)이다. 음(陰)은 채우려고만 한다.
음(陰)은 소유하려고만 한다.
음(陰)길게 연장(延長)유지(維持)하려고만 한다.
양(陽)심(心)은 양심(良心)으로 번뇌 망상을 여의고 해탈열반의 초발심(初發心)이 되고 불심(佛心)된다.
음(陰)심(心)은 음심(淫心)으로 번뇌 망상의 삼독심(三毒心)으로
중생심(衆生心)이 된다.
중생심(衆生心)과 불심(佛心)은 본래 하나이다.
중생과 부처도 본래 하나이다. 마음을 버리느냐? 모으느냐?
마음을 비우느냐? 채우느냐? 마음을 떠나느냐? 마음에 머무느냐? 의 차이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이다.
마음속 욕망의 갈애(愛)태우고 마음을 졸이며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음(陰)심(心) 중생(衆生)을 만들고,
마음속 욕망의 갈애(愛)를 곰 삭이고 마음을 비우고 인욕(忍辱)하는
양(陽)심(心)은 부처(佛)를 만드는 길이다.
나는 과연 오늘하루를 부처님(佛心)을 향하여 살아왔는가?
아니면 중생심에 이끌리어 또다시 음심(淫心)만 키워왔을까?
불자(佛子)님들의 오늘 하루는 또 어떠했을까?
모두가 작심(作心)이나 한 것처럼, 음(陰)심(心)! 번뇌(煩惱)망상(妄想)심(心)을 나(我)로 착각(錯覺)하고 음심(淫心)의 포로(捕虜)가 되어
삼악도(三惡道)의 종자(種子)를 번식(繁殖)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불자(佛子)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단 하루라도 진정한 양심(陽心))으로 양심(良心) 불심(佛心) 부처가 되시길 청원(請願)드려본다.
이것이 회향심(回向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심(佛心)일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